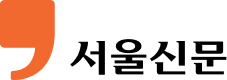“용공난용 연포기재”(庸工難用 連抱奇材).
안중근(1879∼1910) 의사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사살하고 뤼순(旅順)감옥에 수감돼 있던 1910년 3월 “서투른 목수는 아름드리 나무나 진기한 나무를 다루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용공난용 연포기재”라고 휘호했다.
그는 왼쪽에는 ‘경술 3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씀)라고 기재하고 왼손 약지가 잘린 손바닥으로 장인(掌印)을 찍었다.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 유묵을 비롯해 독립지사들의 사상과 제국주의 일본의 집요한 감시 체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관람객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특별전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을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공동 개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실물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체포 직후 촬영했거나 수집한 사진이 부착돼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천264매가 우연히 발견됐으며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감시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 카드에는 한자로 ‘유관순’(柳寬順)이라고 성명이 기재돼 있으며 유관순의 정면과 측면 사진이 부착돼 있다. 지문 번호란에는 ‘87767’과 ‘78768’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 일제가 지문을 채취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 여러 카드가 작성된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독립운동가의 모습 변화를 볼 수 있다.
안창호(1878∼1938) 선생의 경우 수배 당시부터 복역 중에 작성된 것까지 5장의 카드가 전시됐다. 1925년에 작성된 카드에서 안창호는 짧은 콧수염을 길렀으며 젊은 모습이지만 1937년에 작성된 카드에서는 반백의 턱수염과 콧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또 12년 만에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을까 싶을 정도로 연로해지고 수척해진 느낌이 든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제가 사후에도 카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마지막 카드는 그가 순국한 다음 해인 1939년 작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진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는 “이봉창·윤봉길 의사도 순국 후 제작된 카드가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경계 의식이 매우 컸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1919년 결성된 의열단 창단 초기의 단체 사진에 김원봉, 곽재기,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정이소, 김익상을 각각 특정해 표기한 카드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
붓으로 쓴 이봉창(1901∼1932)·윤봉길(1908∼1932) 의사의 선서문은 조선 독립을 향한 열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봉창은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고 썼다. 윤봉길은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고 적었다.
나석주(1892∼1926)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와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소장했던 이른바 데니 태극기 등 약 100점의 유산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전시물을 구성했다.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순국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5명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짧은 동영상도 눈길을 끈다.
근래 민간이 제작한 독립운동가의 AI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호응을 얻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도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